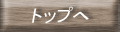『藤の実』(素牛編)

俳 書
『藤の実』(素牛編)

| 秋 |
|
| 関の住、素牛何がし、大垣の旅店を訪はれ侍り |
|
| しに、かのふぢしろみさかといひけん花は、宗 |
|
| 祇のむかしに匂ひて |
|
| 藤の実は俳諧にせん花の跡 | 芭蕉 |
| さぞ砧孫六やしき志津屋敷 | 其角 |
| 雲津川にて船よぶ人多かりけれど、むかふ(う) |
|
| にさしとめて見むかず |
|
| 秋風に耳の垢とれ渡し守 | 去来 |
| 七夕に出て兎も野をかけれ | 酒堂 |
| 七夕や先寄あひてお(を)どり初(ぞめ) | 素牛 |
| 閉閑の頃 |
|
| 蕣や昼は錠おろす門の垣 | 芭蕉 |
| 芭蕉菴に宿して |
|
| 蕣や夜は明きりし空の色 | 史邦 |
| 一通り猪の牙の跡の薄かな | 之道 |
| 渋笠やここで着初めむ花薄 | 丈草 |
| 鵯に立ち別れゆく行脚坊 | 正秀 |
| 塩壺の庇のぞかんけふの月 | 素牛 |
| しら浜や犬吠かゝるけふの月 | 丈草 |
| 京 |
|
| 名月や何に驚く雉の声 | 示右 |
| 大津尼 |
|
| 立待や痺<しびり>直さん臼の上 | 智月 |
| 居待月起て守らん枕挽(ひき) | 仝 |
| 寝待月船も閑(しづか)に行次第 | 仝 |
| 美濃にて宗祇の藤を尋(たづぬる)比 |
|
| 其藤の古根や秋のやどり草 | 荷兮 |
| 藁焚(たけ)ば灰によごるゝ竈馬<イトゞ>哉 | 丈草 |
| 張残す窓に鳴入るいとゞ哉 | 素牛 |
| 酒落堂にて |
|
| 露萩もおるゝ斗(ばかり)に轡虫 | 越人 |
| 湖上吟 |
|
| 田の肥に藻や刈寄する礒の秋 | 素牛 |
| 朝露のいざり車や草の上 | 素牛 |
| 別長崎卯七 |
|
| 枝々に別るゝ秋や唐辛 | 酒堂 |
| 物干にのびたつ梨の片枝哉 | 素牛 |
| 素牛が家に宿して |
|
| 菊の香や御器も其儘宵の鍋 | 支考 |
| 菊の花咲や石屋の石の間 | 芭蕉 |
| 人々嵯峨の宿を |
|
| とはれけるに |
|
| 去来 |
|
| 木の本に円座取巻け小練年 |
|
| 夜一夜笑ふ名月の晴 | 野童 |
| 駒迎鼻毛ひらずに御供して | 素牛 |
| 冬 |
|
| くろみ立沖の時雨や幾所 | 丈草 |
| 有明に成てたびたび時雨哉 | 許六 |
| しがみ付岸の根笹の枯葉哉 | 素牛 |
| 尾張 |
|
| 蓑笠も世に足る人や冬籠 | 露川 |
| 尋元政法師墓 |
|
| 竹の葉やひらつく冬の夕日影 | 素牛 |
| 鞍壺に小坊主乗や大根引 | 芭蕉 |
| 嵐雪の新宅を訪て |
|
| 水瓶や場(には)かたまらぬ冬椿 | 酒堂 |
| 鵜の糞の白き梢や冬の山 | 素牛 |
| 朝霜や聾の門の鉢ひらき | 丈草 |
| 万句興行のみぎりに |
|
| 初霜や小笹が下のえびかづら | 素牛 |
| 大阪 |
|
| 置霜やけふ立つ尼の古葛籠(つづら) | 園女 |
| 鵯や霜の梢に鳴渡り | 素牛 |
| 目をむひ(い)て木兎(みみづく)住むや菴の留主 | 鳳仭 |
| 出屋敷や枝折に枯る樗(あふち)の実 | 洒堂 |
| 詣因幡堂 |
|
| 撫房<ナデボウ>の寒き姿や堂の月 | 素牛 |
| 茶をすゝる桶屋の弟子の寒哉 | 素牛 |
| 枯芦や朝日に氷る鮠(はえ)の顔 | 素牛 |
| 欲填溝壑唯疎放 |
|
| 水草の薦(こも)にまかれん薄氷 | 仝 |
| 雪雲や鬼も肱<カイナ>を出すべう | 去来 |
| 野径亭に諷シて |
|
| 蝋燭のうすき匂ひや窓の雪 | 素牛 |
| 唐犬(たうけん)や扶持にはなるゝ雪の中 | 素牛 |
| 水仙や朝寝をしたる乞食小屋 | 素牛 |
| 加州 |
|
| 椽<たるき>には木練(こねり)釣けり枇杷の花 | 丿松 |
| 春 |
|
| 鶯や雀よけ行えだ移り | 去来 |
| 鶯や根笹をつたふ湯立くど(※「土」+「突」) | 素牛 |
| 新壁や裏も返さぬ軒の梅 | 素牛 |
| 宗鑑の陳迹を尋て |
|
| 梅ちるや観音草の道の奥 | 素牛 |
| 詣聖廟 |
|
| 二月や松の苗売る松の下 | 素牛 |
| 芭蕉菴を出る時 |
|
| 故郷へ雁に壱歩が銭分ん | 洒堂 |
| 燕や赤士道のはねあがり | 素牛 |
| ほそぼそと塵<ゴミ>焚門の燕かな | 丈草 |
| 広き野を只一呑や雉の声 | 鳳仭 |
| とりちらす檜<クレ>木の中や雉の声 | 素牛 |
| 菜の花の匂ひや鳰の礒畑 | 素牛 |
| 野馬(かげろふ)のゆすり起すや盲蛇 | 丈草 |
| 花に寢ぬ是も類か鼡の巣 | 芭蕉 |
| 文台に扇ひらくや花の下 | 素牛 |
| 世の中を見切てちるか山桜 | 許六 |
| うかうかと来ては花見の留主居哉 | 丈草 |
| 夏 |
|
| 卯の花のたえまたゝかん闇の門 | 去来 |
| 郭公声横たふや水の上 | 芭蕉 |
| 竹の子に呼ばれて坊のほとゝぎす | 素牛 |
| かるの子や首指し出して浮藻草<ヒルモグサ> | 素牛 |
| 蓴菜や一鎌入るゝ浪の隙(ひま) | 素牛 |
| 橘や定家机のおき所 | 杉風 |
| 尾張 |
|
| 竹植て竹の子を見る人は誰 | 巴丈 |
| 嵯峨、鳳仭子の亭を訪し比、川風涼しき橋板 |
|
| に踞して |
|
| 涼しさや海老のはね出ス日の陰リ | 素牛 |
| 涼しさや野飼の牛の額つき | 鳳仭 |
| 東武におもむきし頃木曾塚に各吟会して離 |
|
| 別の情を吐く事あり |
|
| 涼風に蓮の飯喰ふ別かな | 史邦 |
| 別史邦吟士 |
|
| 起伏にたばふ紙帳も破れぬべし | 素牛 |
| 猶名残を惜みて行々 |
|
| 石山のほとり一夜を明し |
|
| 行水や戸板の上の涼しさに | 仝 |
| 素牛を宿して |
|
| すゝみ出て瓜むく客の国咄し | 智月 |
| 訪素牛市居二句 |
|
| 蚊遣火の隣は暑しつるめさう | 史邦 |
| 涼しさや竈二つは有ながら | 洒堂 |
| 素牛にこととは侍折ふし、我宿のことし |
|
| げゝれば、隣寺に伴て |
|
| 古寺をかりて蚊遣も夜半かな | 正秀 |
| 客 中 |
|
| くらがりに覆盆子(いちご)喰けり草枕 | 史邦 |
| 芭蕉翁岐阜に行脚の頃したひ行侍て |
|
| 見せばやな茄子をちぎる軒の畑 | 素牛 |
| 子ども等よ昼顔咲キぬ瓜むかん | 芭蕉 |